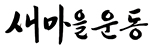<못생긴 남자>라는 연극이 있다. 독일
극작가 마리우스 폰 마이엔부르크의 작
품으로 한국에서도 공연된 바 있다. 주
인공은 회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
지만 추한 외모가 결정적인 단점이다. 타
인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자기가
개발한 상품의 프리젠테이션조차 하지
못하게 될 정도니 말이다. 그는 큰마음
을 먹고 성형수술을 받는데, 결과가 너
무 성공적이어서 많은 여성에게 환심을
사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
런데 성형외과 의사는 성공한 그의 얼굴
을 모델로 여러 사람을 시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복제품’들이 거리에
쏟아지게 된다. 못생긴 남자에서 잘생긴
남자로 변신했다가 다시 얼굴을 잃어버
린 남자로 전락한 주인공은 극심한 정체
성 혼란에 빠지고, 원래의 얼굴을 되찾
으려고 몸부림친다.
‘페이스북’이라는 명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 인간에게 얼굴은 정체성의 그
릇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도 1,2초만 보면 그의 생애 이력과
됨됨이와 성격을 감지할 수 있고, 안색
으로 건강 상태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리
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
졌는지도 금방 포착된다. 호감과 매력도
많은 부분 얼굴을 통해서 느껴진다.
미인이라고 하면 얼굴이 예쁜 사람을
뜻한다. 몸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얼굴
이 추하다면 미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조차도 얼굴
의 아름다움으로 사회적 위신이 좌우되
지는 않는다. 미모에 대한 집착은 인간
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에게 얼굴은 곧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인간의 사회생활은 얼굴의 노
출을 전제로 성립된다. 신분증에는 반드
시 얼굴 사진이 들어가고, 공항에서 탑
승 수속을 하거나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그리고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을 치를
때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머지않아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이 그 임무를 대신할 것이다) 사고
등의 이유로 신체의 다른 부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해도 얼굴만 동일하면 문제가
없다. 반대로 몸은 똑같은데 얼굴이 바
뀌었다면 동일한 인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병원에서 영문 소견서 형식
의 ‘성형 확인증’을 발급받는데, 출국 수
속 때 여권 사진과 다른 얼굴이어도 같
은 인물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담고
있고, 특히 타인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
게 해준다. 그것을 입증하는 흥미로운 실
험이 있다. 자원자들에게 남편들과 아내
들의 개인 사진을 한 무더기 주었는데,
일부는 결혼식날 사진이고, 일부는 결혼
후 25주년 사진이었다. 그 사진들을 가지
고 누가 누구와 부부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 과제였다. 자원자들은 결혼식 날 사
진으로는 알아맞히기 어려워한 반면 25
주년 사진으로는 많이 적중시켰다. 부부
가 오래 살면서 닮아가기 때문인데, 서
로의 미소나 찌푸린 표정을 무의식적으
로 모방한 결과 자주 사용하는 근육과
사용하지 않는 얼굴 근육이 얼굴을 비슷
하게 만든다고 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
화 <베테랑>에 나오는 이 한 마디는 얼
굴과 자존심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 자
신의 부끄러운 행적이 드러났을 때 고개
를 떨구는 행위, 흉악범이 용의자 신분
으로 경찰서에 끌려갈 때 모자와 마스크
를 푹 뒤집어쓴 모습, 어떤 놈인지 얼굴
을 보아야겠으니 공개하라는 시민의 요
구… 결국, 얼굴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
니라 사람됨의 깊은 본질을 드러내는 바
탕화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귀
함이 상당 부분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현
된다고 할 때, 타인이 나의 얼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참한 치
욕의 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더없이
고결한 경지에 오르기도 한다. 타인 앞
에 나를 드러내는 것, 누군가와 대면하
는 것이 늘 긴장을 수반하게 되는 까닭
이 바로 거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