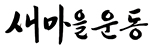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John Bolton)의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장안의 화제이다.
볼턴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소라는 생산적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한사코 저지한 노력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부의 어깃장 속셈도 드러난다.
볼턴의 회고록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볼턴의 회고록은 도덕적 절대주의, 미국 패권주의, 최대한의 압박과 군사사용론이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정리돼 있으며,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볼턴, 가장 추한 사람은 아베 신조”라는 발언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볼턴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어떤 것들이 걸림돌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훨씬 배가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분단된 한반도는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최적화된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쪽에는 무기도 팔고, 세계 전략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을 주둔시키며,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까지 분담시키고 있다.
악마화된 북한의 존재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중국은 북한이 존재함으로 인해 미국과의 대치전선이 휴전선 이남으로 묶이는 결정적 이익이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남북이 하나가 된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회고록 속의 아베가 볼턴과 야합하는 모습은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 발휘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투영시키고 있다.
이렇듯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살필 때 남북이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볼턴의 회고록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사회 일각이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잘못된 환상인지를 일깨워준다.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치할 필요도 없다.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의 존재 역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한다. 미국 주류사회는 입에 발린 수사적 표현과는 달리 결코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와 주변국 특히 미국 주류 사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 역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 교포 연계망 등을 망라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도 안된다. 지난 시절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의 노력을 한 바가 있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다.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한글을 모른다. 이들이 한반도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볼턴은 북미 정상이 합의에 이르는 것을 결국 막아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당사자인 우리는 볼턴보다 최소한 수 십 배의 수고로움을 더해야 하지 않겠는가? |